천 붕 ( 天 崩)/박영동
2020-06-11
김원유 jnnews.co.kr@hanmail.net
김원유 jnnews.co.kr@hanmail.net

칠십 객 노인과 삼십 대 아들이
문중 선영자리 살피러
거친 숨 몰아 산을 오른다
묵묵히 따르던 아버지가
“아들아 이 자리 어쩌냐”
“아부지 맘에만 들면 좋습니다”
아부지의 아부지를 모실 생각이던
발걸음이 뚝 멈춰지고
가슴은 타오르며 먼 들판을 노리는데
흐릿해지는 산천을 뒤로하고
눈물 조각 비수 되어 발등에 꽂는다
모질게 갈라온 거친 세월의 끝자락
이 자리에 영영 머물지도 모른다는 상념
이리도 허망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태어날 적엔 연유도 모른 채
그토록 서럽게도 울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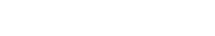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개최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예수병원 유지재단-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예수병원 유지재단-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 스노우의원 피부과, 호성보육원에 300만원 기부
전주 스노우의원 피부과, 호성보육원에 300만원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