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장례식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시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 장례 기간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 후 3일 정도 소요된다. 화장터의 빈공간이나 스님의 일정에 따라 5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통야와 장례식을 합쳐 하룻만에 하는 하루장(2일장)도 행해지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장례식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시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 장례 기간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 후 3일 정도 소요된다. 화장터의 빈공간이나 스님의 일정에 따라 5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통야와 장례식을 합쳐 하룻만에 하는 하루장(2일장)도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장례 흐름은 다양하며,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장례의 흐름은 “사망 → 운송 → 침경(枕経) → 회의 → 제안(장례의 장식 등) → 납관(納棺) → 설영(設営) → 통야(通夜)→장의(葬儀, 告別式) → 출관(出棺) → 화장(火葬) → 유골안치, 초 7일의 법요(法要) → 법요 참가자 기념품 제공”이다.
운송은 고인이 임종한 후 사망 확인을 한 후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병실에서 병원의 영안실로 옮겨진다. 영안실에는 몇 시간 정도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장례업체 등에 의뢰하여 시신을 안치 장소로 옮긴다. 이 때 곧바로 고인을 관에 넣을 수 없으므로 침대차로 이송한 후 자택 혹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모신다.
침경(枕経)은 고인의 임종 후, 영이 망설이지 않고 성불하도록 인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경을 읽어 주는 의식이다. 회의는 고인과 유족의 의사 확인, 장례식의 형태, 일정 등 상세하게 결정하는 것이며, 이 회의에 따라 장례의 장식 등이 제안된다.
이후 유족은 장례 절차를 결정하고 고인을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힌 후 입관한다. 이때 고인을 납관하는 관에는 생전의 애용품이나 좋아하는 음식 등 다양한 부장품을 함께 넣기도 한다. 설영(設営)은 제단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보통 고인이 죽고 나서 통야나 장례까지의 사이에는 침식(枕飾り)을 한다. 침식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이나 옆에 상 같은 것에 음식을 올려놓고 간단한 촛불과 향을 피우는 것이다. 이때 상 같은 작은 제단에 작은 꽃 장식품을 올려놓거나 양쪽에 꽃장식을 하기도 한다. 침식(枕飾り)에 사용되는 꽃은 고인과 유족의 지인들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통야 전까기 사용하므로 사용기간은 매우 짧다.
통야(通夜, 쯔야)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죽은 다음 날로 장례·고별식을 실시하기 전날 밤에 가족이나 친척, 고인에게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모여 고인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이다. 고인이나 고인의 유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조화환처럼 보내는 공화(供花)는 보통 통야의 시작 전이나 시간대에 맞게 보내진다. 통야의 날에 도착한 공화는 장례식장에 장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장례식과 고별식은 통야의 다음 날에 행해진다. 화장 시간에 따라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보통 시작 약 1시간 전부터 참석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통야나 장례식·고별식에 사용되는 제단이 장례의 본 제단이다. 생화제단 또는 일본 전통의 시라키제단(白木祭壇)이 사용되는데, 시라키제단에도 대부분 꽃이 장식된다.
장례식 및 고별식은 불교식의 경우 참석자가 참석하면 승려가 입장하여 독경을 한다. 종파에 따라 다르나 독경 시간은 30~60분 정도이다.
장례식·고별식이 끝난 후에는 ‘이별의 의식’으로 출관의 준비에 들어간다. 상주나 유족, 참석자들이 관에 꽃을 넣어 고인과 마지막 이별을 한다. 관에 꽃을 넣은 후에는 관 뚜껑을 닫고 화장장을 향해 출관하는데, 출관에 앞서 상주가 조문객에게 인사를 한다. 출관이 끝나면 그대로 화장터로 옮겨 화장한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넣는 수골(骨上げ)을 실시한다. 그리고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7일째에 유족이 고인을 추도하고 고인을 공양하기 위해 법사를 행한다. 이것은 초 7일의 법요(法要)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장례식·고별식의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납골당에 유골을 납입하는 의식인 납골식이 있는데, 시기는 주로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49일째의 49일 법요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근조화환처럼 보내지는 공화(供花)는 주로 통야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지는데, 장례식까지 보내지 못했다면 초 7일의 법요(法要)부터 49일 법요 사이에 보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위와 같이 고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제단이 만들어 놓고,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추모하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다른 장례문화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꽃의 사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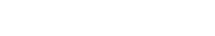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개최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예수병원 유지재단-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예수병원 유지재단-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 스노우의원 피부과, 호성보육원에 300만원 기부
전주 스노우의원 피부과, 호성보육원에 300만원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