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8개 지구가 선정되어 총 3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하여 생활·복지·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장기 목표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8개 지구가 선정되어 총 3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하여 생활·복지·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장기 목표에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촌 활성화는 물리적 정비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은 ‘돌봄’과 ‘건강’에 있다. 현재 다수의 도시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촌으로 이주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의료 인프라 부족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번 농촌 공간 정비 또한 단기적 효과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만의 ‘그린케어 스테이션(Green Care Station)’은 전남 농촌공간정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대만 농업위원회는 2017년부터 농촌 고령자를 위한 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마을의 창고 등을 개조하여 만든 그린케어 스테이션은 건강관리, 간호사 방문, 원예치유, 재활운동,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제공 등을 통합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농촌 커뮤니티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노인의 신체·정신적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촌복지 시스템이다.
그린케어는 단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지역 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예컨대 마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식단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 일자리와 순환경제가 활성화된다. 또한 지역의 공실 건물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설치되는 만큼 공간 정비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는 현재 전남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농촌형 돌봄센터’나 ‘복합커뮤니티 공간’ 설치가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중앙부처 사업에 따라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남도 자체적으로 보건복지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전남형 농촌복지 모델을 정립하는 작업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자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농촌공간 정비는 이러한 인구 구조를 반영해 고령자가 이용하기 쉬운 공간 동선, 보행 안전성, 응급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설계가 필요하다. 단지 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람 중심의 공간 재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농촌 정비의 본질은 농촌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 은퇴자든, 원주민 고령자든 ‘살 수 있고’, ‘돌봄 받을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형 ‘그린케어 농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 실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전남의 농촌은 단지 살기 좋은 곳을 넘어, 누구나 나이 들어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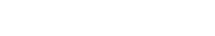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이삭몬테소리어린이집 “나눔 실천 기금” 전달식 기금 전달식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이삭몬테소리어린이집 “나눔 실천 기금” 전달식 기금 전달식 진행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관계 구축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관계 구축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
 한국명장연구소 허북구 소장, 완주 허브스팜에서 ‘귀농귀촌’ 강의
한국명장연구소 허북구 소장, 완주 허브스팜에서 ‘귀농귀촌’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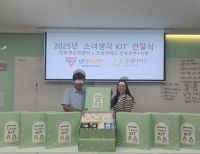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인후청소년센터, ‘소녀생각 KIT’전달식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인후청소년센터, ‘소녀생각 KIT’전달식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