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고독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감정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한다. 고독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의학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전남인터넷신문]고독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감정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한다. 고독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의학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은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아 방치되기 쉽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고안한 대표적인 도구가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고독감 척도(Loneliness Scale)이다.
UCLA 척도는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결핍을 수치로 나타낸다.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낀다’와 같은 일상적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선택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크다는 의미다. 이 척도의 장점은 고독을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입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거나 특정 집단의 고독 수준을 추적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점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독의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실제 개입이 필요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치유농업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치유농업은 단순한 농사 체험이 아니라,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수확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관계와 의미를 되찾도록 돕는 통합적 치유 접근이다. 참가자들은 흔히 “흙을 만지는 시간이 곧 대화의 시간이 된다”고 말한다. 땅을 함께 가꾸며 이웃과 어울리는 경험은 심리적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복원한다.
국내외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12주간의 원예치유 프로그램은 UCLA 척도를 세 차례 측정하여 효과를 검증했다. 초기 평균 52점이었던 점수는 종료 후 39점으로 낮아졌고, 참가자의 80% 이상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즐거워졌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마을 정원 조성 프로젝트에서는 6개월간의 참여 끝에 귀농인의 평균 고독 점수가 18% 줄었고, 이웃과의 대화 빈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ption)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치유농업이 효과적이라는 직관적 확신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계량화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치유농업은 경험적·정서적 효과가 중심이 되는 활동이지만,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UCLA 척도는 이러한 계량화의 핵심 도구가 된다. 단순히 “좋아졌다”라는 주관적 소감을 넘어서, 프로그램 전후 점수 변화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복지기관의 예산 배정, 학문적 연구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즉, 치유농업의 성과를 수치화하는 것은 행정적·학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근거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사전 진단을 통해 참가자의 고독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중간 점검에서는 점수 변화 추이를 보며 활동 강도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종료 후 사후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수치로 입증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재측정을 통해 관계망 유지와 재발 방지까지 관리할 수 있다. ‘측정 → 개입 → 재측정 → 지속 관리’의 선순환 구조는 치유농업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전문 치유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점수 하락이 반드시 치유농업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생활환경 변화, 개인적 사건, 사회적 지원망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UCLA 척도는 상담, 면담, 다른 심리검사와 병행할 때 더 정확한 진단 도구로 기능한다. 또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율적 독립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결핍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LA 척도와 치유농업의 결합은 큰 의미를 지닌다. 척도가 마음의 온도를 알려주는 체온계라면, 치유농업은 그 온도를 따뜻하게 높이는 난로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측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개입이다. 수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행동으로 이어갈 때, 비로소 고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상에 대응할 수 있다.
치유농업의 미래는 그 효과를 얼마나 잘 계량화하고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각적 경험을 수치로 환원하는 일은 때로 불완전할 수 있으나, 계량화를 통해 치유농업은 개인적 치유의 장을 넘어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 UCLA 척도는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토대이자, 치유농업을 사회적 자산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열쇠이다.
참고문헌
김현주. 2025. 보이지 않는 감정의 체온계, UCLA 고독감 척도. 전남인터넷신문 치유농업과 음식 칼럼(2025-08-12).
Holt-Lunstad, J., T.B. Smith, M. Baker, T. Harris, and D. Stephenson,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227-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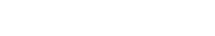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이삭몬테소리어린이집 “나눔 실천 기금” 전달식 기금 전달식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이삭몬테소리어린이집 “나눔 실천 기금” 전달식 기금 전달식 진행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관계 구축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관계 구축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
 한국명장연구소 허북구 소장, 완주 허브스팜에서 ‘귀농귀촌’ 강의
한국명장연구소 허북구 소장, 완주 허브스팜에서 ‘귀농귀촌’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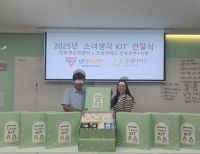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인후청소년센터, ‘소녀생각 KIT’전달식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인후청소년센터, ‘소녀생각 KIT’전달식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