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세상에는 처음 접하면 거부감이 크지만, 익숙해질수록 매력을 발산하는 음식이 있다. 프랑스의 블루치즈와 한국 남도의 나주 홍어가 대표적이다. 두 음식은 모두 발효의 산물이며, 강렬한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바로 그 향이 맛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세상에는 처음 접하면 거부감이 크지만, 익숙해질수록 매력을 발산하는 음식이 있다. 프랑스의 블루치즈와 한국 남도의 나주 홍어가 대표적이다. 두 음식은 모두 발효의 산물이며, 강렬한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바로 그 향이 맛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블루치즈는 세계적인 고급 식재료로 보편화된 반면, 나주 홍어는 여전히 특정 지역의 음식으로만 남아 있거나, 때로는 냄새 때문에 얕잡아보는 음식으로 취급되곤 한다. 이 차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과 문화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블루치즈는 치즈 속에 푸른 곰팡이를 퍼뜨려 만든 발효 치즈다. 프랑스의 로크포르(Roquefort), 이탈리아의 고르곤졸라(Gorgonzola), 영국의 스틸턴(Stilton)이 대표적이다. 치즈 덩어리에 바늘로 구멍을 내어 공기를 통하게 하면 곰팡이가 번져 푸른 결을 만들고, 특유의 곰팡내가 난다.
이 향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일 만큼 강하지만, 미식가들은 그 안에서 깊고도 세련된 풍미를 즐긴다. 블루치즈는 와인, 빵, 견과류, 꿀 등과 곁들여야 진가가 드러난다. 오늘날에는 고급 레스토랑뿐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발효 치즈다.
나주 홍어 또한 발효에서 비롯된 강렬한 향을 품고 있다. 발효가 깊어질수록 암모니아 향이 진해져 코와 눈을 자극한다. 누군가에겐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진미로 다가온다. 중요한 것은 이 향이야말로 홍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다. 블루치즈에서 곰팡내를 빼면 더 이상 블루치즈가 아니듯, 홍어에서 냄새를 제거하면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
두 음식은 냄새를 다른 재료와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길들인다. 블루치즈는 와인이나 견과류와 곁들일 때 풍미가 극대화되고, 홍어는 돼지고기 수육과 묵은 김치와 함께 삼합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억지로 냄새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새로운 맛을 창출하는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음식의 위상은 극명하게 다르다. 블루치즈는 유럽 귀족들의 식탁에서 시작해 전통을 쌓으며 오늘날에는 국제적 고급 식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강한 냄새조차 풍미 깊음을 상징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소비된다. 반대로 삭힌 홍어는 여전히 지역 음식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대중문화 속에서는 ‘도전 음식’처럼 다뤄지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똑같은 발효 음식인데도 블루치즈의 냄새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해석되고, 홍어의 향은 저급하거나 특이한 냄새로 폄하되는 현실은 뼈아프다. 이 차이는 음식 자체보다 음식에 부여되는 사회적 맥락과 태도의 문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치즈는 국가의 자존심이자 문화적 자산이 되었다. 곰팡내는 문화의 일부로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홍어는 오랫동안 냄새나는 음식, 기피 음식이라는 이미지도 다소 있다. 발효의 미학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희화화하거나 도전거리로만 소비한 결과다. 그런데 홍어는 남도의 음식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다. 나주의 전문점에서 내어 놓는 한 접시는 단순한 별미가 아니다. 발효와 조화, 공동체의 기억이 함께 담긴 문화적 산물이다.
홍어 장인들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손님의 기호에 맞게 숙성 단계를 조절하고, 향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완성한다. 이는 단순한 조리 기술이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지혜다. 여기에 현대 셰프들이 새로운 해석을 보탠다면, 나주 홍어는 더 이상 얕잡아보는 음식이 아니라 블루치즈처럼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블루치즈와 나주 홍어는 모두 냄새 때문에 미움받고, 또 냄새 때문에 사랑받는 음식이다. 그러나 블루치즈가 세계적 고급 식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나주 홍어도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차이는 음식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해석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홍어의 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을 즐길 수 있는 언어와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나주 홍어는 이미 남도의 삶 속에서 길들여진 발효의 야생마다. 이제는 한국 음식 문화의 무대에서 당당히 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세워야 할 때다.
참고문헌
허북구. 2025. 와인의 바디감과 나주 홍어 풍미 미학.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08).
허북구. 2025. 프랑의 요리 맛 언어로 풀어낸 나주 홍어의 풍미.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07).
허북구. 2025. 이탈리아 음악 용어로 풀어낸 나주 홍어의 풍미.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05).
허북구. 2025. 국악의 음색으로 풀어낸 나주 홍어의 맛.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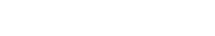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석 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석 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가족센터 업무 협약식 진행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가족센터 업무 협약식 진행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와 함께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와 함께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