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나주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곰탕이다. 투명하면서도 깊은 국물, 얇게 썰린 양지,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어우러지는 한 끼는 나주 사람들의 일상과 공동체 문화를 동시에 대변한다. 나주 곰탕의 풍미는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맑고 순박하지만, 오래 끓여낸 고기와 뼈의 진액이 은근하게 녹아들어 깊은 울림을 남긴다.
[전남인터넷신문]나주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곰탕이다. 투명하면서도 깊은 국물, 얇게 썰린 양지,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어우러지는 한 끼는 나주 사람들의 일상과 공동체 문화를 동시에 대변한다. 나주 곰탕의 풍미는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맑고 순박하지만, 오래 끓여낸 고기와 뼈의 진액이 은근하게 녹아들어 깊은 울림을 남긴다.
나주 곰탕의 이 점은 한국의 전통 수묵화와 닮아있다. 수묵화는 색채를 배제하고, 오직 먹의 농담과 붓질의 흐름만으로 대상을 표현한다. 겉보기에 단조로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먹이 퍼져나가는 결, 번짐 속에서 드러나는 농담의 깊이, 여백이 주는 상상력의 확장이 나타난다.
나주 곰탕의 국물 또한 투명하지만 그 속에 무수한 결이 스며 있다. 표면은 맑아 보이나 숟가락을 깊이 넣어 맛을 보면, 뼈와 살에서 우러난 진한 풍미가 층층이 번져 나와 마치 수묵화의 먹빛처럼 은은하고도 묵직하다. 서울식 곰탕이 뽀얗게 우러난 백색의 진함을 자랑한다면, 나주 곰탕은 오히려 투명함 속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는 농도 짙은 채색화보다 절제된 수묵화의 미학에 가깝다. 먹 하나로 산수를 그려내듯, 나주 곰탕은 재료를 최소화하고, 국물의 맑음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세계를 드러낸다. 나주의 곰탕집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넣는 순간, 혀끝에 스며드는 은근한 맛은 수묵화 속 산수의 여백처럼 여운을 남긴다.
수묵화의 중요한 특징은 ‘여백의 미’다. 비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채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곰탕 역시 마찬가지다. 화려한 향신료도, 과도한 양념도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고기 본연의 맛, 국물의 순정함이 드러난다. 여백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다.
곰탕의 맑은 국물은 투명한 여백처럼, 사람의 기억과 감각을 불러내어 각자의 경험으로 채우게 한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 시장의 분주한 풍경, 명절 아침의 식탁이 그 여백을 메운다.
수묵화가 한 획의 붓질로 천지를 담아내듯, 곰탕은 한 그릇 속에 긴 시간을 담는다. 뼈를 고아내는 시간, 국물이 끓는 소리, 불 앞에서의 기다림이 모두 녹아 들어간다. 보통의 국이나 찌개가 즉각적 맛의 폭발이라면, 곰탕은 차분하게 우러나는 인내의 맛이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어 서서히 형태를 이루듯, 곰탕의 맛도 시간의 스며듦을 통해 완성된다.
나주 곰탕을 수묵화에 비유할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적 수사가 아니다. 둘 다 본질적으로 절제와 여백, 은근함과 번짐을 미학으로 삼는다. 곰탕의 국물은 마치 안개 낀 산수화처럼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광을 보여준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오래 머무른다. 이는 한국적 미학의 근원과도 닿아 있다. 겉으로는 단출하되 속으로는 무궁한 여운을 남기는 방식, 절제 속에서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강렬한 자극과 화려한 맛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나주 곰탕 한 그릇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맛은 무엇인가, 진짜 풍미는 어디서 오는가. 수묵화가 화려한 채색을 거부하면서도 오히려 깊은 세계를 열어주듯, 곰탕은 군더더기를 덜어낸 투명한 국물 속에서 삶의 깊이를 보여준다.
나주 곰탕의 풍미와 수묵화는 서로 닮아있다. 그것은 절제의 미학, 본질로의 귀환, 그리고 여백 속에서 피어나는 풍요로움이다. 국물의 맑음은 수묵의 여백처럼, 먹의 번짐은 고기의 은은한 맛처럼 다가온다. 한 그릇의 곰탕 앞에서 우리는 수묵화 한 폭을 감상하듯, 눈으로는 단순함을 보지만 마음으로는 무궁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나주 곰탕이 지닌 풍미의 힘이며, 수묵화와 공유하는 한국적 미학의 정수다.
참고문헌
허북구. 2025. 나주 곰탕, 영화 시네마 천국을 닮은 맛.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11).
허북구. 2025. 나주 곰탕의 풍미와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11).
허북구. 2025. 나주 생고기 식문화와 폴 고갱의 원초적 색채.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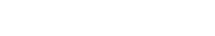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석 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석 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가족센터 업무 협약식 진행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가족센터 업무 협약식 진행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와 함께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와 함께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동참







